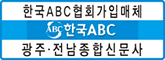처참하고 안타깝고 어처구니없는 사태 앞에선 할 말을 잃는다.
처참하고 안타깝고 어처구니없는 사태 앞에선 할 말을 잃는다.
이태원 현장에 무슨 설명을 보태고 어떤 말을 덧댈 수 있겠는가. 이태원 비극을 겪고 며칠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간 너무 국뽕에 취했던 건 아닐까. 몇몇 화려한 성과에 들떠 우리는 선진국 착시에 빠졌던 건 아닐까.
법을 ‘핑계’ 대기에는 이태원 참사는 너무나 심각한 무책임과 직무 태만을 드러내 보였다. 사고 전날부터 참사의 전조가 나타났고 112신고 전화가 계속 울렸지만, 경찰 시스템은 요지부동이었다. 이태원 참사 다음 날 인도에선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막 재개통한 현수교가 몰려든 인파를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는 바람에 140여 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무자격 업체의 날림공사, 관리·감독 태만이 겹친 전형적 인재라고 한다.
만약 이태원 참사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인도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저런 식으로 냉소하지 않았을까.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중동 등 정치적 민주화나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의 끔찍한 재난 소식들을 접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언젠가부터 우리 마음속엔 묘한 우월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린 선진국이라고 틀린 얘기는 아니다.
세계 10위 교역 규모에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나라. 삼성 현대차 LG같은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를 가진 나라.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망과 행정 인프라를 갖춘 나라.
무엇보다 BTS, ‘미나리’, ‘오징어 게임’ 등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팝, K무비의 나라이니 이쯤되면 우쭐할 법도 하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는 더 납득이 안 되는 거다. 우리가 냉소했던 속칭 ‘후진국형’ 재앙이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혐오와 분노에 사로잡힌 미치광이가 총을 난사하고, 끔찍한 폭탄 테러가 종종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런 류의 압사사고는 우리가 아는 선진국에선 일어나지 않는다.
구름 인파가 모일 것 같으면 담당구청이나 경찰서가 본능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안전한 나라다. 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이런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는 게 진짜 선진국이다. 수없이 많은 참사를 겪었고, 그로 인해 두꺼운 법령과 많은 처벌조항을 가졌음에도, 우리에겐 그런 선진국형 시스템, 법에 없어도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무형의 동력이 없었던 거다.
참사를 겪고 나니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 대처능력이 후진국보다 못 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했다. 사고수습을 책임져야 할 장관이나 국무총리 등 속속 드러나고 있는 고위 관료들의 당일 행적이나 참사 후 태도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들은 마치, 사실상 새 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았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한 사람을 대기발령 조치하며 미봉(彌縫)된 채로 3개월여 동안 동상이몽(同床異夢)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 관료와 경찰 수뇌부들이 보여준 무책임한 일련의 ‘범죄 행위’들이 자행된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사고 당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민노총 등의 집회 관리를 마친 9시30분 경부터 이태원 현장에 도착한 11시 5분까지 95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까지의 감찰 결과다. 그와 용산서는 처음에 사고 직후 도착했다고 거짓말, 허위 공문서 작성까지 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에게 보고도 1시간 이상하지 않았으며, 다음날 오전 대통령 방문 때에야 동행했을 뿐 새벽 시간 현장 장관 브리핑 등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 올라가 팔짱을 끼고 사고 현장을 ‘구경한’ 사진만 있다. 그의 사고 시간 전후 휴대 전화와 무전 통신 내역 등이 주목된다.
서울청 상황관리실장 류미진은 자기 사무실에서 당직을 서는 ‘땡땡이’ 짓을 했다. ‘압사 위험’ 신고가 빗발치는 112 임무를 방기(放棄)하고 잠을 잤는지, 인터넷을 했는지, 영화를 봤는지, 어떤 전화 통화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건이다.
150명 이상이 걸어가다 갇히고 넘어져 목숨을 잃는 사고 책임이 오롯이 일선 경찰 지휘관 2명의 책임일 수는 없다. 어쩔 수 없는 성격도 있고, 안전 불감증을 비롯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문화와 의식 수준 탓도 있다. 사고가 터지자마자 ‘죽일 놈’ 찾기에 혈안이 돼 있는 이들이 현장 지휘관들의 직무유기에는 침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