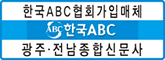전남투데이 김우정 기자 | 한지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한지의 발전과 국제화를 꾀하는 세미나가 5일 서울 장충동 종이나라박물관에서 열렸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과학연구 100년을 맞아 마련한 ‘전통한지 다시 날개를 달다’ 주제의 학술 행사다. 세미나에서는 이오규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연구원의 ‘한지의 기원과 한지 제조 기술의 특징’, 손계영 대구가톨릭대 도서관학과 교수의 ‘조선 시대 고문서 종이 분석’, 서지학자인 남권희 경북대 명예교수의 ‘고서의 표지와 능화문’ 발표가 진행됐다.
이오규 연구원은 “한지(韓紙)는 한국의 종이를 의미하며,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서 그 용어가 처음 발견됐다”며 “이전 통일신라 시대에는 ‘계림지’, 고려 시대는 ‘고려지’, 조선 시대는 ‘조선지’로 불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일본의 종이 제조법은 ‘가둠뜨기’이고, 우리나라는 ‘흘림뜨기’를 한다”며 “그러나 한국에서도 가둠뜨기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소개했다.
가둠뜨기는 닥 섬유의 풀어진 지료를 가둠 틀과 발이 설치된 도구를 사용해 종이를 뜨는 기술이고, 흘림뜨기는 가둠 틀 없이 발만 올려진 도구를 사용한 종이 뜨는 법이다.
1933년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종이연구가 다드 헌터의 저서에는 우리나라에서 가둠뜨기 기법을 활용해 종이를 떴다는 기록이 나온다고 한다.
손계영 교수는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문중에서 소장한 고문서 1천504건을 분석한 뒤 발의 형태, 밀도, 섬유 종류를 조사했다.
그는 “용액 속에서 분해된 식물 섬유를 한 겹의 얇은 막으로 변환한 것이 종이 발명의 시초”라며 “물속에서 분해돼 떠 있는 섬유를 한 겹으로 걸러내는 작업은 종이 제조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섬유를 한 겹으로 걸러내 종이를 뜨는 도구를 ‘발’이라 한다.
손 교수는 “3∼4세기에는 천으로 만든 발을 사용했지만, 종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량의 종이를 만들기 위해 대나무 발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조선시대 문서지에는 대나무 발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 앞서 ‘잊혀진 한지 이야기 그리고 그 울림’이라는 주제의 전통한지 전시회 개막식도 진행됐다.
8일까지 종이나라박물관 1층 전시장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한지 연구 역사를 비롯해 한지 원료와 제조 공정, 다양한 전통한지 종류별 유물 등을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