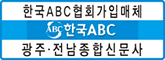농경 시대, 경제의 기본 단위였던 가정에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노동력은 매우 소중한 자산이었다. 이는 산업화 시대에도 이어져 “인구는 곧 국력”이라는 말까지 나왔었다.
산업혁명 이후 근대국가는 개인과 가정, 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를 하나로 묶어냈다. 한 국가는 다른 국가와 희소한 자원을 놓고, 경제성장률 등 다양한 지표에서 경쟁했다.
군사력과 생산성도 치열한 경쟁 대상이었는데, 이를 떠받치는 중요한 지표가 또 인구였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인구 성장률이 조금만 정체돼도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는 우려 섞인 말이 나올 정도였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어바인 캠퍼스 사회학과의 왕펑 교수는 이러한 오래된 통념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 그는 먼저 전 세계 인구가 지난 70년간 무려 세 배 이상 폭증해 80억 명을 넘겼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되는 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전 세계 인구가 영원히 증가하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정점을 찍고 다시 줄어드는 시나리오가 원래부터 더 그럴듯한 경로였다고 말한다.
중국이 60년 만에 인구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발표하자마자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로스 두댓(Ross Douthat)이 “고령화 세상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두댓은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번성하는 제로섬 게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더 많은 개인이 자유롭게 행복을 누리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썼다.
인구가 줄어드는 돌이킬 수 없는 추세를 먼저 인정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자.
첫째, 세대 간 적극적인 부의 이전
특히 선진국에서 노년층, 장년층이 젊은 세대와 부를 나눠야 한다. 정치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장년층, 노년층 유권자의 비위를 맞추는 편이 쉬운 길이다. 관료들도 하던 대로 하면 되는 편을 선호할지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는 나이 든 이들에게 배정된 자원을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집을 사고, 사업을 벌이는 걸 지원하는 데 현명하게 나눠 쓰는 사회와 국가가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노인(만)을 위한 나라(gerontocracy)로 남아 도태되고 말 것이다.
둘째, 혁신만으로는 안 돼, 적극적인 실천과 접목이 필요
사실 기술 혁신 자체는 지금 이 순간도 부단히 일어나고 있다. 더 중요한 건 새로운 기술을 원활히 접목해 혁신을 꽃피울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물리적인, 또 문화적인 인프라를 지원하는 일이다. 인구 구조가 바뀐 세상에서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다.
셋째,지상전(地上戰)의 한계: 군인이 없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이 명제는 어느 정도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겪지 않았다면, 러시아군은 동원령을 통해 훨씬 더 큰 군대를 조직해 전쟁을 벌였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출산율이 더 낮았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좌지우지하는 전쟁이라도 결국 군의 전력은 병력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대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넷째,인구가 아니라 평균 연령이 국력이다?
총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생률을 인구 보충 출생률(replacement level)이라고 부른다. 한국의 경우 출산율만으로는 인구 보충 출생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이민의 장벽마저 높다.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은 장기적으로 한국보다 우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나라 안에서 여러 도시나 사회를 비교해 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 특히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아 젊은 가족이 모여드는 곳이 번창한다.
다섯째, 아프리카 대륙의 위상에 주목하라
고령화는 주로 부유한 나라, 선진국에서 두드러지는 추세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가장 비켜서 있는 대륙이 바로 아프리카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는 2050년 25억 명, 2100년에는 40억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들 중 일부는 아프리카를 벗어나 다른 곳에 정착할 것이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디아스포라는 21세기 후반부의 지정학과 문화적인 변동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인구를 곧 국력의 척도로 삼은 다양한 슬로건이 지금의 관점에서 다소 불편한 이유는 아마도 개인의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람과 삶을 숫자로 치환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추세라면, 이제는 개개인의 행복에 좀 더 신경 쓰는 문화와 제도를 가꿔나가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는 현명한 자세일 것이다.
columnist, ‘Ross Douthat’의 ‘고령화 사회의 특징’ 중에서
조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