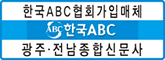판소리명창에게 쉼 없는 학습은 필수 조건임에 분명하다. 또한 자기법제를 이룬 판소리명창이 누구나 강조하는 것이 바로 ‘독공’이다. 천이두는 스승으로부터 소리를 배우는 과정을 ‘삭히는 과정’이라면, 그 소리를 토대로 자기만의 소리를 만드는 과정을 ‘새기는 과정’이라 했다.
독공은 바로 자신의 독특한 성음을 얻는 ‘새기는 과정’의 필수적 절차인 셈이다.
천이두는 그의 저서 ‘천하명창 임방울’에서 <세상과 격리된 공간에서 오직 소리에 매진하는 독공의 시간은 임방울에게도 여러번 있었다.
17세 무렵 변성기로 목이 변하자 지리산으로 들어가 수 개월간, 그리고 여인에 빠져 지내는 자신을 꾸짖는 스승 유성준의 가르침에 다시 독공을 했다.
또한 1929년 상경하여 명성을 얻은 후인 1930년대 초반에도 광주 송영감집에서 1년간 독공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밝히고 있다.
1929년 11월 13일자 동아일보 기사에는 콜럼비아사에서 취입한 조선 가곡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
25세의 나이에 선 첫 무대에서 환호를 받으며 데뷔했던 임방울의 서울 활동에 관한 첫 기록인 셈이다.
그의 회고에 의하면 1929년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조선명창대회에서 김창환의 주선으로 소리를 하게 되었다 한다.
남루한 차림의 데뷔 무대에서 명성을 얻은 그의 소리를 음반사에서는 앞다투어 녹음했고 1929년부터 1941년까지 콜럼비아, 오케, 빅터, 기린, 시에론 등 유성기음반사를 통해 100장이 넘는 춘향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음반을 출시하게 되었으니, 이것만으로도 당시 그의 인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임방울은 1936년 대동가극단에 참여하여 춘향전·심청전·흥보전을 공연했고 1938년 2월에는 조선성악연구회의 ‘창극좌’의 별주부전에 토끼역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또한 김성권에 의하면 부친 김동욱이 조직한 협률사에서 임방울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한다.
이와같은 예처럼 타계하기 전까지 많은 기간동안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했기 때문에 임방울의 주 활동분야를 창극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짜여진 판에서 소리하는 것을 싫어했던 탓에 임방울의 주 활동분야는 창극보다는 판소리였으며, 메여있는 것을 싫어했던 탓에 단체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그의 모습은 늘 자유인이었다.
창극을 하더라도 자신의 기지를 더 발휘하기를 원했고, 그로 인해 다른 출연자들이 진땀을 흘린 적이 여러 번이라 한다.
이는 대본과 상황의 제약을 받는 창극보다는 가창자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상황을 전개할 수 있는 판소리에 대한 그의 선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1933년에 동일창극단에 참여했을 때도 창극보다는 판소리를 주로 공연했다 하며, 창극을 주로 공연하는 단체보다 무용, 땅재주렷낱갬판소리 등 여러 종목을 공연하는 ‘포장걸립’에서 소속되어 판소리 공연하는 것을 선호했다.
대본을 따르지 않는 자유로움과 내키지 않으면 그 어떤 자리라도 박차고 일어서는 그의 성미는 어쩌면 좁게는 현장에서 청중들과 소통하는 즉흥성과 넓게는 당대와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시대를 반영하는 판소리의 속성과 닮아있다.
타계하기 전인 1960년경 일본공연 후 공안기관에 끌려갔던 일이 있었고, 마지막 무대였던 김제공연에서 수궁가 한 대목을 부르다 흥보가로 다시 수궁가로, 적벽가로 대목을 바꾸어 부르다 쓰러진 그의 모습은 어쩌면 그의 생애에 추구했을 자유의 단면이리라.
공연도중 쓰러진 후 6개월간 투병중에 있던 임방울은 1961년 3월 8일 57세를 일기로 타계한다.
생전에 ‘쑥대머리’로 만인을 울렸던 그의 장례는 ‘전국 국악인장’으로 치뤄졌으며, 소복을 입은 200여 명의 여류명창이 운구하는 가운데 다시 만인을 울리며 떠났다.
그의 유해는 망우리에 안장되었다가 1988년 경기도 여주의 남강공원으로 이장되었다 한다.
임방울은 어전에서 벼슬을 제수 받은 적도 없고, 또 인간문화재로 지정 받은 바도 없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서민적 판소리의 죽음’이라 했던 것은 생전에 그는 무대보다는 서민들의 삶터를 찾았고, 소리를 듣고자 하는 이들이 있는 곳이면 장소를 불문하고 소리를 나누었으며, 우아하고 고지식한 소리보다는 민초들의 눈물같은 소리를 남겼기 때문이다.
공연장을 찾은 각설이패들에게 항상 무료로 공연을 볼수있게 했던 따스함이나, 지방공연 도중 출연료는커녕 끼니를 굶고 있을때 동료들의 힘을 돋우기 위해 밥타령을 불렀다는 일화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한다.
먼저 어려움을 감수하고 주변을 돌보는 심성을 가졌으며, 울릉도·흑산도와 같은 섬지방까지 공연단을 조직하여 활동했던 그는 어쩌면 서민들의 삶 속에 숨 쉬었던 광대의 전형이다.
조은별 기자